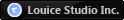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
그는 나를 시험해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신문을 들여다본 적도 거의 없었고, 또 최근 들어 책 한 권 들추어 본 일도 전혀 없었다. “당신은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삶도 거부했고, 자신과 사회의 이익도 거부했고, 시민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거부했고, 자기 친구도 거부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쨌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따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목표들도 단념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추억까지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전 당신이 삶의 치열하고 힘찬 순간들을 살아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자신이 가졌던 훌륭한 인상들을 당신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이제 당신의 꿈과 절실한 희망이란 고작 홀수와 짝수, 검은색과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 열두 숫자들 같은 것들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제발, 그만 하십시오, 미스터 에이슬리, 제발. 더 이상 떠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걸 알아 두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잠시 동안 그것들 모두를, 심지어는 추억마저도 머리에서 떨쳐 버린 것뿐이에요. 제 형편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10년이 지나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ㅡ『노름꾼』,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pp.252-253 |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예전의 모습을 타인에게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지금의 나를 본다. 어쩌면 나는 타인의 발화에 의해 존재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모두가 나를 떠나고 누구도 나에게 내 옛모습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나를 잊게 될 것이다. 지금도 내 기억 속엔 나를 통한 나의 기억보다 나를 통한 타인의 기억이 더 많다. 우리가 손을 맞잡을 때 내게 느껴진 따뜻함은 당신의 따뜻함이었으며 우리가 입을 맞출 때 내게 전해진 사랑은 당신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눈을 바라볼 때 내게 보여진 슬픔은, 그 슬픔은, 다만 당신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추억이여…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