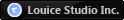베토벤: 3대 피아노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
글: 김태우
http://www.goclassic.co.kr/basic/199908.html
Ludwig van Beethoven
(1770 - 1827)서양음악의 작곡기법과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소나타(Sonata)'가 될 것이다. 이는 성악곡에 반대되는 기악곡을 통칭하는 말로 우리가 접하는 고전음악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독주악기나 관현악이나, 실내악을 위한 기악곡들이며, 이것들은 모두 큰 의미의 '소나타'다. 이것이 피아노와 같은 독주악기를 위한 경우에 우리는 그대로 '소나타'라고 부르지만 그외의 경우에 '교향곡'이라고도 부르며 '현악 사중주'라고도 하며 '협주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컨데 '소나타'라는 것은 빠르고 느린 몇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품을 일컫는 것이다. 작품으로서의 소나타 이외에 악장의 작곡양식으로서의 '소나타'가 있다. 어떤 음악에 대해 설명할 때 '1악장, Allegro, 소나타형식'과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소나타들의 첫 악장은 거의 예외없이 소나타형식을 취하고 있다.
음악양식으로서의 소나타 피아노와 같은 독주악기를 위한 소나타는 3악장의 구성이 흔하지만, 실내악이나 관현악을 위한 소나타 (현악사중주곡, 교향곡)는 4악장의 구조가 많은데 이 경우 세 번째 악장은 짧은 무곡이 삽입된다.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소나타의 첫 악장은 소나타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소나타형식이란 어떤 것인가.
소나타 형식은 비교적 빠른 템포를 취하여 크게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혹은 도입부, 발전부, 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제시부에서는 제 1주제가 으뜸조로 나타나며 이 주제의 조성을 곡의 조성으로 본다. 제 1주제는 조성에 관계없이 활기차고 생기있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주제가 제시되면 그 선율과 화성을 소재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경과구가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2주제가 시작된다. 2주제의 조성은 1주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1주제의 으뜸조에 대한 딸림조나 관계장조(1주제가 a단조였다면 2주제는 C장조가 된다는 식으로)로 나타나게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활기있는 제1주제에 비해 2주제는 서정적이고 '한 숨 돌리는 듯 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전파시대의 소나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러한 특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개부는 제시부에 포함된 소재들을 음악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부분이다. 1주제의 화성, 2주제의 화성, 경과부의 선율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다양한 조성이 등장한다. 대위법적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현부는 제시부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2주제의 조성이 제 1주제와 동일하다. 음악의 오묘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대조적인 분위기와 상이한 - 실제로는 종속적인 - 조성을 가지는 두 가지의 주제가 발전부에서의 복잡한 전조를 거듭하여 그 음악적인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두 가지의 주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는 분위기마저 흡사하다. 대립하는 두 가지 사상이 갈등을 겪은 후에 융화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섭리가 아닐까? 음악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깊이있고 도덕적이며 건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작곡양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지만 소나타형식은 가장 쉽고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악장은 통상적으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느린 악장이다. 조성은 소나타형식의 1,2주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1악장의 딸림조 혹은 관계장조이며, A-B-A의 세 도막형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A부분은 아름다운 선율이 가요풍으로 노래되고, B부분은 딸림조로 전조되어 다소 폴리포닉 (몇 개의 선율선이 겹쳐져서 진행되는 양식)하게 진행된다. 되돌아오는 A부분은 첫 머리보다 화성적인 구조가 약간 복잡하다. 소나타형식의 2주제와 마찬가지로 '한 박자 쉰다'는 느낌이 강하다.
마지막 악장에는 론도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템포는 첫 악장보다 훨씬 빠르고 주제의 동기는 짧고 간결하다. 론도(Rondo)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끼고 몇 가지의 다른 경과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경과부와 경과부사이에는 반드시 주제가 삽입되며 직접 다음의 경과부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소나타를 구성하는 악장들은 전체적으로 변증법적인 구조를 지닌다. 대립되는 성격의 악장이 2개 연속하여 등장하고 종악장에서 갈등은 해소된다. 요컨데 정-반-합이다. 악장을 구성하는 소나타형식과 같은 원리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곡의 구성은 가장 많은 작곡가들의 공감을 일으켰고 서양음악의 '주류'로 자리하게 하였다.
베토벤은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다. 이것은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된 음악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위대한 유산이다. 비록 최만년에 소나타를 작곡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베토벤의 전생애에 걸친 작곡양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32곡의 소나타 중 어느 한 곡도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곡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 곡은 '3대 소나타'라고 불리는 8번과 14번, 그리고 23번이다. 이들은 각각 '비창', '월광', '열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8번을 제외하고는 작곡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붙여진 이름이며 상업적인 냄새도 풍기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곡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베토벤을 진정한 낭만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근거는 평생동안 끊임없이 추구한 새로운 양식에의 시도에 있다. 교향곡에 스케르초를 도입한 것이라든가, 5번 교향곡에서 같은 리듬의 주제를 전곡에 걸쳐 집요하게 다루는 모습과, 주제를 전개시키고 발전시키는 천재적인 솜씨, 피날레에 느닷없이 끼어드는 스케르쪼의 동기, 합창을 도입한 교향곡, 3번 교향곡의 피날레에 등장한 대규모의 변주, 독주악기의 카덴짜로 시작하는 협주곡등등, 그가 시도한 새로운 양식은 수도 없을 정도이다. 피아노 소나타도 예외가 아니어서 '3대 소나타'라고 불리는 소나타들 중 정형적인 소나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23번 하나 뿐이며, 8번과 14번에는 당시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1934, 1933 Mono
Piano Sonatas No. 8 "Pathetique", No. 14 "Moonlight", No. 23 "Appasionata"
BEETHOVEN
Artur Schnabel (piano)
EMI 8CD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1악장 (991KB)
2악장 (706KB)
3악장 (481KB)MP3 Player가 없으시다면 
이 소나타는 베토벤 자신이 "비창적 대 소나타(Grande Sonate pathetique)"라고 명명한 작품이다. 처음 듣는 순간부터 곡이 끝날 때 까지 한 순간도 귀를 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8번 소나타의 작곡양식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다. 8번 소나타는 그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호모포닉(단선율을 위주로하는 화성진행)한 곡이다. 선율은 명쾌하고 왼손의 반주도 극히 단순하다. 두터운 화음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곡의 구성이 너무나 극적이고, 맹렬한 분위기와 감미로운 노래, 연주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교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연주효과로 인해 극히 산뜻한 효과를 얻어 내었고 나아가 대중적인 인기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op.13 "비창" 그러나 8번 소나타가 파격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작곡양식의 변화가 아니고 1악장의 제시부 앞에 커다란 서주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느린 속도를 지시하는 Grave라는 악상기호와 곡을 개시하는 c단조의 으뜸화음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이 곡의 제목인 '비창 (혹은 비애)'라는 말은 이 서주의 분위기에 의한 것이다. 서주는 점차 고조되어 오른손의 레치타티보, 빠르게 하강하는 선율로 변화하면서 Allegro di molto e con brio의 소나타형식 제시부로 돌입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서주의 재료가 소나타형식의 발전부와 코다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다. 왼손의 맹렬한 트레몰로를 타고 등장하는 1주제는 그 예가 없을정도로 공격적이며, 이 주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더욱 극적이다. 2주제는 1주제의 분위기와 대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석대로라면 C단조의 관계장조인 E-flat장조로 작곡되어야 하지만 e-flat단조를 취해 어두운 느낌을 지속시키고 있어 소나타 작곡양식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금 벗어나 있다. 하지만 2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E-flat장조가 나타나게 된다. 곡의 마무리부분에 다시 서주의 주제가 등장하고 제 1주제만을 이용해 악장을 끝맺는다.
2악장은 전형적인 가요 형식의 악장으로 나른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A-B-A의 전형적인 세도막형식, 주제의 멜로디는 대중음악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친근한 것이다. 3악장 역시 전형적인 론도이다. A-B-A-C-A-B-A-coda라는 명확하고 교과서적인 론도이며 첫 악장과 같은 조성이지만 어둡고 비극적인 느낌은 찾아볼 수 없다. 선율은 어떤 것이나 쉽고, 화성적으로 교묘한 지연(delay)이 이루어져있기는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도 음악을 감상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다. 이 곡을 모르는 사람도 제목만은 들어본 적이 있을정도로 잘 알려진 곡이다. '월광(달빛)'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죽고 난 뒤인 1832년, 시인이었던 H.F.L.Rellstab가 이 곡의 1악장을 두고 '달빛에 물든 루체른 호반위를 지나는 조각배를 떠오르게 한다'는 발언을 한 데에서 연유된 것이므로 굳이 제목이 주는 이미지와 곡의 이미지를 연관시킬 필요는 없으며, 그렇다고 애써 거부할 필요도 없다. 1악장의 음악적 이미지를 시인이 이야기한 회화적 이미지와 연관시키는 것은 분명 이 곡의 감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서 2악장과 3악장까지 연관시켜 보아도 재미있다.
피아노 소나타 14번, C sharp단조, op.27-2 "월광" 이 곡 역시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1악장과 3악장이 소나타형식이며 2악장이 짧은 미뉴엣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다지 특이할 것이 없지만 1악장의 템포가 'Adagio sostenuto'라는 사실, 보통 활기찬 느낌의 1악장과는 달리 꿈꾸는 듯이 느껴지는 나른한 선율이 지속된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한 첫악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모차르트는 첫악장을 주제와 변주로 구성한 전례도 있었다). 또한 소나타형식의 화성전개도 매우 비전형적인 것이지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악장전체가 숨막힐 것 같은 고요로 가득 차 있으며 선율은 마음이 아플정도로 감상적이고 아름답다. 악장 전체를 통해 한 번도 감정의 기복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
2악장은 활기찬 미뉴엣이다. 완전한 악장의 기능을 한다기에는 앞 뒤의 악장이 너무 대규모적이어서 고요한 첫 악장과 격렬하기 이를 데 없는 종악장 사이를 이어주는 간주곡같은 인상이다. 멜로디는 우아하고 리듬은 재미있다. 두 가지의 미뉴엣, 그리고 첫 번째 미뉴엣의 반복이라는 매우 고전적인 형식이며 미뉴엣의 반복이 끝나는 순간 단절없이 3악장으로 돌입한다.
3악장은 'Presto agitato(매우 빠르고 격하게)'라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속도기호가 붙어있다. 대규모의 소나타형식이며,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음악보다도 격렬하고 열정적인 음악이다. 서두의 격한 16분음표들의 돌진은 1악장의 서두주제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이다. 숨막힐 듯 긴박한 1주제에 이어 선율선이 제법 살아있는 제 2주제가 등장하는데 관계장조를 취한다는 원칙은 여기서도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1주제의 급박한 분위기는 2주제에 와서 더욱 고조되고 비극적인 느낌까지 준다. 1악장이 가지고 있던 팽팽한 긴장을 3악장에서 분노의 표출에 가까운 형태로 무너트리고 있는 것 같다. 발전부 역시 긴박한 선율의 연속이며 이 급속한 진행은 단 한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가 곡이 가장 크게 요동치며 현란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트릴이 나타나는 순간에 갑작스레 adagio로 돌변하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된다. 이어 다시 presto의 템포가 돌아오고, 2주제를 소재로 한 짤막한 코다로 들어간다. 코다는 두 개의 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2주제를 소재로 전반부를, 1주제를 소재로 후반부의 종결을 짓고 있다. 역시 두 주제 사이의 타협은 조성적인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베토벤의 모든 피아노 소나타가운데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반면 그 내용이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음 베토벤의 소나타를 접하는 사람에게 있어 8번이나 14번처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곡도 아니다. 이 곡은 연주하기도 무척 어렵다. 이 곡을 칠 때는 건반도 별나게 무겁게 느껴지고(느낌만이 아닌 것 같다) 요구되는 손가락 기교도 상당히 고도의 것이다. 1악장과 3악장의 폭발하는 듯 한 코다는 상당한 팔힘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불타는 듯한 에너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정말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곡을 연주해낼수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정도로 이 소나타는 훌륭하다. 연주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금욕적일 정도의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op.57 "열정" 1악장 첫머리부터 곡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피아니시모로 두 옥타브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선율을 제시하는 1주제는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 정도이며 처음으로 포르테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Allegro assai(매우 빠르게)라는 악상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다지 빠른 템포라는 느낌은 받을 수 없다, '운명의 동기(빰빰빰 빠암 하는)'가 왼손에 등장하고 가끔씩 폭발하는 포르테와 왼손의 셋잇단음표가 주는 불길한 초조함 속에서 밝은 제 2주제가 서서히 떠오른다. 이 주제는 1주제의 관계장조인 A-flat장조이므로 3대 소나타중 유일하게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는셈이다. 이후 복잡한 발전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재현부가 나타난 후 거대한 코다로 들어간다. 음악은 난폭해질 대로 난폭해져서 아르페지오가 건반을 휩쓰는 듯이 지나가고 그야말로 뜨거운 느낌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음악적인 고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고조의 절정에서 음악은 갑자기 사그라들면서 템포를 떨어뜨리고 불길한 느낌의 '운명의 테마'가 고요하게 몇 차례 반복되다가 완전히 음악이 정지한다. 그리고 갑작스레 piu allegro(더욱 빠르게), 포르테시모의 '운명의 동기'가 튀어나오고 2주제를 소재로 하여 잠시 진행되다가, 다시 운명의 동기를 소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주제를 소재로하여 급격히 힘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숨막히는 고요 속에 악장을 끝맺는다. 피아니시모로 시작하여 피아니시시모로 끝을 맺는다는 놀라운 발상이다. '차가운 껍질과 뜨거운 알맹이'라고나 할까?
2악장은 주제와 변주, 음악의 깊이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단정하게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주제가 제시되고 변주를 거듭해 나갈수록 음악은 고조되어 나간다. 강약의 대비에 의해 고조되어 나간다는 것 보다 뒤로 갈수록 음악적인 감흥이 넘쳐나는 것이다. 악장의 종결 직전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보면 그 행복감은 정말 참기가 힘들 정도이다. 마지막에는 다시 주제가 재현되고, 의사끝맺음(거짓종지)가 있은 다음 갑작스레 격렬한 7도의 아르페지오가 연주되고(이 효과는 정말 압도적이다) 바로 3악장으로 연결된다.
3악장은 소나타형식의 커다란 악장이다. 앞 악장에서의 격한 화음을 연속해서 두들겨대고 계속 아래로 하강하여 첫 번째 주제를 제시하게 된다. 1주제의 경과부는 상당히 길고 또 비관례적으로 제시부를 반복하지 않는데, 대신 발전부와 재현부를 통째로 반복하게 되어 있다.이 길다란 반복의 목적은 뒤이어지는 코다의 격렬함을 훨씬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악장의 코다는 베토벤이 정말 대단한 각오로 만들어낸 격한 악상이다. 베토벤은 이 코다의 효과를 위해 3악장의 첫머리 템포를 Allegro ma non tanto(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로 지시했는데, 그것은 Presto의 코다가 주는 효과를 한껏 살리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코다의 도입은 무곡풍의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 그리고 이어지는 종결은 제 1주제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말 인정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압도적인 효과를 가진 음악이다.
추천음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좋은 연주가 정말 많다. 이 곡들을 연주한다는 것이 피아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필생의 대업이므로 어느 누구의 연주를 듣더라도 좋은 연주를 들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연주들을 꼽으라면, 우선 박하우스와 켐프를 그리고 길렐스, 리히터, 솔로몬, 루빈스타인, 브렌델...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좋은 연주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연주들은 특별히 빼어난 연주들이다.
1980, 1973 Digital, Stereo
Piano Sonatas No. 8 "Pathetique", No. 14 "Moonlight", No. 23 "Appasionata"
BEETHOVEN
Emil Gilels (piano)
DG 9CD그 중 굳이 '최고의 연주'를 뽑으라면, 눈 딱 감고 에밀 길렐스를 꼽고싶다. 유감스럽게도 '3대 소나타'가 한 장에 들어가있는 음반은 없지만 낱장으로 발매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집을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 완전한 전집은 아니지만 (길렐스는 전곡 녹음 도중 사망하였다) 녹음되어 있는 곡들은 어느 것이나 최고의 연주들이다. 전곡으로 재발매되면서 음질도 매우 좋아졌으며, 작품번호가 없는 몇몇 곡들까지 추가된 데다 가격도 버짓 프라이스로 책정되어 오히려 경제적이다. 동일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길렐스의 베토벤 소나타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봄바람처럼 따스하며 때로는 믿을 수 없을만큼 과격하다. 특히 "3대 소나타"의 연주는 빼어나다.
위에 MPEG3로 제공된 슈나벨의 30년대 연주는 최초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이라는데 일단 큰 의의가 있는 연주다. 지금 들어도 전혀 위화감 없이 서정미와 열정이 공존하는 훌륭한 연주로 레퍼런스 음반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특히 3대 피아노 소나타중에선 14번 "월광"과 23번 "열정"이 뛰어나다.
한 곡씩 따로 선택하라면, 8번은 박하우스(58년, DECCA), 14번은 켐프(65년, DG)와 폴리니, 23번은 리히터와 박하우스, 아쉬케나지의 연주를 권하고 싶다. 연주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박하우스, 리히터, 아쉬케나지가 연주하는 23번 3악장을 비교하면서 들어보면 정말 굉장하다. 세 명 다 굉장히 빠른 템포를 취하고 있지만 박하우스의 연주는 터치에 대단한 무게가 실려있어서 마치 돌진하는 덤프트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리히터의 23번은 어느 모로 보나 최고의 23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음반인데, 특히 이 곡 특유의 뜨겁고 맹렬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연주도 감히 비교될 수 없다. 아쉬케나지의 연주는 앞의 두 사람과는 맥락을 완전히 달리하는 연주인데 한 부분씩을 뜯어본다면 좀 약해보이는 면도 없지 않지만 곡의 전체적인 균형이 완벽하다는 점이 특히 훌륭하다. 음색도 대단히 세련되어 있고 기분좋게 흐르는 스케일 큰 음악은 상쾌하게까지 느껴진다. 아마 2악장의 연주만을 놓고 본다면 가장 뛰어난 연주일지도 모른다.
14번과 23번은 굴드(67년, CBS)나 호로비츠(72년, CBS)의 독특한 연주도 들어볼 수 있다. 좋은 연주가 너무나 많아서 고민스러운 곡들이지만, 해석도 모두 다양하므로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폭 넓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글쓴날짜: 1999/08/04
 |
|





 Parts of the outer layer of some joint capsules are thickened to form ligaments. Ligaments connect bone to bone while tendons connect muscle to bone (Figure 1).
Parts of the outer layer of some joint capsules are thickened to form ligaments. Ligaments connect bone to bone while tendons connect muscle to bone (Figure 1). Joint mice are pieces of bone or cartilage found within the joint cavity and may be the result of a fracture. These produce pain when lodged between the articular surfaces and may also produce arthritis. Surgical removal is usually successful (Figure 2).
Joint mice are pieces of bone or cartilage found within the joint cavity and may be the result of a fracture. These produce pain when lodged between the articular surfaces and may also produce arthritis. Surgical removal is usually successful (Figure 2). The stifle joint is locked in an extended or straightened stiff position whenever the horse is unable to "unlock" the loop of ligaments from over the bony projection. Sometimes a slap on the croup will cause the horse to jump and "unlock" the stifle joint. Often his "locking" will reoccur. Whenever surgery is necessary to correct the condition, the medial patellar ligament is cut on the inside of the stifle joint in order to prevent further "locking" (Figure 3).
The stifle joint is locked in an extended or straightened stiff position whenever the horse is unable to "unlock" the loop of ligaments from over the bony projection. Sometimes a slap on the croup will cause the horse to jump and "unlock" the stifle joint. Often his "locking" will reoccur. Whenever surgery is necessary to correct the condition, the medial patellar ligament is cut on the inside of the stifle joint in order to prevent further "locking" (Figure 3). Bone spavin is defined as an inflammation of one or more bones of the hock andmost often causes an arthritic condition of the affected bones. In bone spavin the joint between the bones on the inside of the hock become immovable. Quick stops,such as those which occur during roping and other stresses, along with mineral deficiencies, may produce bone spavin. Horses with full, well-developed hocks tend to have less incidence of bone spavin than those with narrow, thin hocks. Bone spavin occurs on the inside of the hock (jack spavin). It may occur between the bones within the hock joint and cannot be seen or palpated (blind spavin). A large percentage of horses affected with blind spavin recover completely.
Bone spavin is defined as an inflammation of one or more bones of the hock andmost often causes an arthritic condition of the affected bones. In bone spavin the joint between the bones on the inside of the hock become immovable. Quick stops,such as those which occur during roping and other stresses, along with mineral deficiencies, may produce bone spavin. Horses with full, well-developed hocks tend to have less incidence of bone spavin than those with narrow, thin hocks. Bone spavin occurs on the inside of the hock (jack spavin). It may occur between the bones within the hock joint and cannot be seen or palpated (blind spavin). A large percentage of horses affected with blind spavin recover completely.
 The cause may be due to nutritional deficiencies, accidental injury to the hock joint or the hocks being too straight (hereditary). If the condition is caused by conformation or too straight hocks, it cannot be treated successfully. Veterinarians hav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and to advise the best treatment. Anti-inflammatory drugs may help bog spavin caused by nutritional deficiencies or injury. The drugs decrease inflammation and prevent swelling of the joint capsule. A bandage around the hock prevents excessive build-up of fluid and swelling. The horse is rested for 4 to 6 weeks. Adding vitamins and minerals to the diet may relieve bog spavin. Horses 6 months to 2 years of age are most often affected with bog spavin.
The cause may be due to nutritional deficiencies, accidental injury to the hock joint or the hocks being too straight (hereditary). If the condition is caused by conformation or too straight hocks, it cannot be treated successfully. Veterinarians hav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and to advise the best treatment. Anti-inflammatory drugs may help bog spavin caused by nutritional deficiencies or injury. The drugs decrease inflammation and prevent swelling of the joint capsule. A bandage around the hock prevents excessive build-up of fluid and swelling. The horse is rested for 4 to 6 weeks. Adding vitamins and minerals to the diet may relieve bog spavin. Horses 6 months to 2 years of age are most often affected with bog spavin. This condition is characterized by new bone growth which occurs on the first, second or third phalanx (high or low ringbone). The phalanges are the three small bones extending from the fetlock to the hoof (Figure 7).Ringbone is more common on the forefeet than the hindfeet.
This condition is characterized by new bone growth which occurs on the first, second or third phalanx (high or low ringbone). The phalanges are the three small bones extending from the fetlock to the hoof (Figure 7).Ringbone is more common on the forefeet than the hindf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