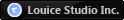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시론]남덕우/경제실상 다시 보자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적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9년 이후 하향 추세에 있고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연율 5.3%이나 계절 변동을 조정하고 나면 0.7%에 불과하다. 국민 소비지출, 국내 설비투자, 외국인투자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해외투자는 증가 추세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은 GDP의 2∼3%에 불과해 해외부문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다.
▼성장패턴 한계… 기술혁신 필요▼
이와 같은 거시지표의 추세를 짚어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의 성장 패턴이 한계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정자들은 이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생산 증가와 경제 성장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 하나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의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입요소의 총합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불변이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오늘날까지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고 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의 투입요소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며 바로 그것이 1인당 소득 2만달러로 가는 길이다. 종래와 같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단순히 생산규모를 확대해 돈을 버는 방식에 집착하고 기술혁신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선진국의 기술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진국이 영원히 선진국권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경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교육,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제도와 관행, 정책과 경제운영 스타일, 기업환경 등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들 요인의 한국적 실상은 어떠한가? 먼저 교육 분야를 보자. 2001년 현재 공교육비 지출은 GDP의 7.1%,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약 1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등교육은 아직 창조력 계발보다 대학입시 문제에 매달려 있고 25∼34세 인구 중 대졸자가 43%를 차지해 OECD 평균(28%)을 크게 상회하지만 질적으로는 교수 1인당 학생수(53명)가 가장 많고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청년실업자를 배출하는 데 한몫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와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GDP의 5.3%(2000년)로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해의 미국에 버금가는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에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세계 주요 특허권 등록 점유율(1998년)도 미국의 36%, 일본의 25%에 비해 한국은 0.87%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좌우하는 근본과제인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품개발의 실적은 매우 적다.
▼현실 직시 못하는 것이 ‘위기’▼
생산성 증가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의 성과가 이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제도와 관행, 자원 배분,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만성적 부동산투기, 무원칙한 정부규제, 법치주의 경시, 이념갈등, 사회안전망 미비 등이 직간접으로 생산성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실상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거나 도외시하면 그 자체가 위기적 현상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출처 : 동아일보 (2004.06.11)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적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9년 이후 하향 추세에 있고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연율 5.3%이나 계절 변동을 조정하고 나면 0.7%에 불과하다. 국민 소비지출, 국내 설비투자, 외국인투자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해외투자는 증가 추세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은 GDP의 2∼3%에 불과해 해외부문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다.
▼성장패턴 한계… 기술혁신 필요▼
이와 같은 거시지표의 추세를 짚어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의 성장 패턴이 한계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정자들은 이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생산 증가와 경제 성장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 하나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의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입요소의 총합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불변이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오늘날까지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고 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의 투입요소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입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며 바로 그것이 1인당 소득 2만달러로 가는 길이다. 종래와 같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단순히 생산규모를 확대해 돈을 버는 방식에 집착하고 기술혁신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선진국의 기술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진국이 영원히 선진국권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경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교육,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제도와 관행, 정책과 경제운영 스타일, 기업환경 등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들 요인의 한국적 실상은 어떠한가? 먼저 교육 분야를 보자. 2001년 현재 공교육비 지출은 GDP의 7.1%,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약 1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등교육은 아직 창조력 계발보다 대학입시 문제에 매달려 있고 25∼34세 인구 중 대졸자가 43%를 차지해 OECD 평균(28%)을 크게 상회하지만 질적으로는 교수 1인당 학생수(53명)가 가장 많고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청년실업자를 배출하는 데 한몫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와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GDP의 5.3%(2000년)로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해의 미국에 버금가는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에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세계 주요 특허권 등록 점유율(1998년)도 미국의 36%, 일본의 25%에 비해 한국은 0.87%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좌우하는 근본과제인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품개발의 실적은 매우 적다.
▼현실 직시 못하는 것이 ‘위기’▼
생산성 증가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의 성과가 이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제도와 관행, 자원 배분,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만성적 부동산투기, 무원칙한 정부규제, 법치주의 경시, 이념갈등, 사회안전망 미비 등이 직간접으로 생산성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실상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거나 도외시하면 그 자체가 위기적 현상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출처 : 동아일보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