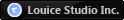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
나는 단박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챘다. 그 유태인 할망구가 그렇게 황홀해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척 놀라는 것 같더니 곧 행복에 빠져들었다. 마치 천국에 있는 듯 보여서 나는 아줌마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했다. 나는 마약에 대해서는 침을 뱉어주고 싶을 정도로 경멸한다. 마약 주사를 맞은 녀석들은 모두 행복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끝장이다. 행복이란 것은 그것이 부족할 때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 하긴 오죽이나 간절했으면 주사를 맞았을까만은 그 따위 생각을 가진 녀석은 정말 바보 천치다. 나는 절대로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몇 차례 마리화나를 피운 적은 있지만, 그래도 열 살이란 나이는 아직 어른들로부터 이것저것 배워야 할 나이다. 아무튼 나는 그런 식으로 행복해지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더 좋다. 행복이란 놈은 요물이며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놈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어차피 녀석은 내 편이 아니니까 난 신경도 안 쓴다. 나는 아직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다. 행복을 찾는답시고 천치짓을 하는 녀석들을 막을 법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거리는 것뿐이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나는 이제 행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또 발작을 일으키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하밀 할아버지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 바로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말했다. ㅡ pp.99~100 “두려워할 거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사실 말이지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말처럼 얄팍한 속임수도 없다. 하밀 할아버지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군이며 두려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오랜 경험을 믿으라고 했다. 하밀 할아버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메카에까지 다녀왔다. “너 같은 어린애가 거리에서 혼자 돌아다니면 못 써.” 나는 웃음을 떠뜨렸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정말 내가 본 아이들 중 제일 예쁘구나.” “당신도 멋져요.” 그녀가 미소지었다. “고맙다, 얘야.”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갑자기 내 속에서 희망 같은 게 솟았다. 당장 내가 따로 살 곳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살아 있는 한 아줌마를 버리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미래를 생각해두어야 했다. 나는 밤마다 미래를 꿈꾸곤 했다. 누군가와 바닷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어떤 사람. 그렇다. 나는 가끔 로자 아줌마를 배신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죽고 싶어질 때 머릿속으로 그랬을 뿐이다. 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이란 것에는 항상 대단한 힘이 있다. 로자 아줌마나 하밀 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에게조차도 그것은 큰 힘이 된다. 미칠 노릇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행동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네고, 희망을 일깨우고, 친절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한숨지으며 떠났다. 나쁜 년. ㅡ pp.108~109 ㅡ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용경식 옮김), 문학동네 |
TAGS 발췌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2164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