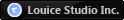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아닌 시인이라고
소설은 거의 읽지 않고, 시는 잘 읽지 않는다. 새로 나온 시를 읽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새로 나온 시집을 사는 경우는 없다. 한 권에 5-6000원씩 하는 시집의 99%는 쓰레기다. 그 중 80%는 읽고 이해해도 감흥이 없는 것들이고, 10%는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9%는... 글쎄 아마 시인 자신의 소장용이 아닐까?
그것 참 건방진 말이로군!, 하지만 건방진 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는 출판사 쪽이 아닐까? 거지보다 시인을 많이 만들어내 거지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단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시집의 경우, 전집을 선호한다. 일단 싸다. 시인이 시 뿐 아니라 산문도 써서 발표했을 경우 같이 들어있다. 수필가보다, 소설가보다 시인의 산문에 들어있는 문장이 탁월하다. 어찌됐건 전집을 사는 취향 때문에 내가 읽은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 문단이 가진 잣대로 검증된 시인들이다. 그리고 역시 대부분의 경우, 죽었다.
술을 마시면 뒤적이는 게 기형도라면, 술을 마시고 베고 자는 것이 김종삼이다. 「아우슈비츠 라게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전집을 사들었지만, 문제는, 한자가 너무 많다. 너무 간단한 단어까지, 시인의 시적 기법이 아닌 단순 단어의 한자어.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전집이라는 데 있다. 편집자가 재량으로 충분히 한글을 같이 써도 되는... 아니, 되야 하는 일이다. 읽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함도 아니고, 유리 책장에 넣어둘 소장용도 아니라면 이 정도는 돼 있었어야 하는 일이다. 향찰과 이두는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서 한문은 그대로 싣는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짓이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 남대문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빈대떡을 만드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한자를 잘 알아야만 하는, 시인이라.
그래서 거듭 건방진 건 출판사 쪽이다.
김현은 1986년 일기에서 안병무의 책, 『역사 앞에 민중과 더불어』를 읽고 이렇게 썼다.
「 "민중문학이 민중의 소리와 감정을 지식인의 언어로 바꾸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지식인)에게 전달해주듯이 민중 신학도 민중 사실을 신학적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다. 곧 번역 작업인 것이다. 지식인에게 민중의 말과 희망과 의지를 전달해주는 통로, 그것이 민중 신학이다"(32~33). 묘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민중문학은 지식인을 위한 문학이란 말인가. 」
안병무의 말이 맞다. 김현 스스로는 비교적 그렇지 않았지만, 지식인들은 지들끼리 놀았다. 민중을 얘기할 때도. 예수를 얘기하는 애들이 예수처럼 안 살 듯, 해탈을 바라는 중들이 싯달타처럼 안 살 듯. 아니, 잠깐은 그렇게들 사는 척 하듯.
그걸 몰랐다니, 묘한 일이다.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아닌 시인이라고
소설은 거의 읽지 않고, 시는 잘 읽지 않는다. 새로 나온 시를 읽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새로 나온 시집을 사는 경우는 없다. 한 권에 5-6000원씩 하는 시집의 99%는 쓰레기다. 그 중 80%는 읽고 이해해도 감흥이 없는 것들이고, 10%는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9%는... 글쎄 아마 시인 자신의 소장용이 아닐까?
그것 참 건방진 말이로군!, 하지만 건방진 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는 출판사 쪽이 아닐까? 거지보다 시인을 많이 만들어내 거지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단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시집의 경우, 전집을 선호한다. 일단 싸다. 시인이 시 뿐 아니라 산문도 써서 발표했을 경우 같이 들어있다. 수필가보다, 소설가보다 시인의 산문에 들어있는 문장이 탁월하다. 어찌됐건 전집을 사는 취향 때문에 내가 읽은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 문단이 가진 잣대로 검증된 시인들이다. 그리고 역시 대부분의 경우, 죽었다.
술을 마시면 뒤적이는 게 기형도라면, 술을 마시고 베고 자는 것이 김종삼이다. 「아우슈비츠 라게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전집을 사들었지만, 문제는, 한자가 너무 많다. 너무 간단한 단어까지, 시인의 시적 기법이 아닌 단순 단어의 한자어.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전집이라는 데 있다. 편집자가 재량으로 충분히 한글을 같이 써도 되는... 아니, 되야 하는 일이다. 읽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함도 아니고, 유리 책장에 넣어둘 소장용도 아니라면 이 정도는 돼 있었어야 하는 일이다. 향찰과 이두는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서 한문은 그대로 싣는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짓이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 남대문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빈대떡을 만드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한자를 잘 알아야만 하는, 시인이라.
그래서 거듭 건방진 건 출판사 쪽이다.
김현은 1986년 일기에서 안병무의 책, 『역사 앞에 민중과 더불어』를 읽고 이렇게 썼다.
「 "민중문학이 민중의 소리와 감정을 지식인의 언어로 바꾸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지식인)에게 전달해주듯이 민중 신학도 민중 사실을 신학적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다. 곧 번역 작업인 것이다. 지식인에게 민중의 말과 희망과 의지를 전달해주는 통로, 그것이 민중 신학이다"(32~33). 묘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민중문학은 지식인을 위한 문학이란 말인가. 」
안병무의 말이 맞다. 김현 스스로는 비교적 그렇지 않았지만, 지식인들은 지들끼리 놀았다. 민중을 얘기할 때도. 예수를 얘기하는 애들이 예수처럼 안 살 듯, 해탈을 바라는 중들이 싯달타처럼 안 살 듯. 아니, 잠깐은 그렇게들 사는 척 하듯.
그걸 몰랐다니, 묘한 일이다.
TAGS 일기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1187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