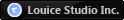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라캉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글을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쓰고 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와 코카콜라보틀링으로 사업을 나눈 후에 더욱 효율적이 되었다, 고 어디선가 보았는데 -- 코카콜라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암으로 세상을 떴다. 아마 내가 이에 관한 책을 읽은 것은 5년 정도 전이었을 것이다. 톰 피터스나 피터 드러커, 혹은 워렌 버펫에 관련한. 코카콜라를 따라 먹는 내 컵에는 코카콜라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이것은 사실 맥도날드에 들렀다가 빅맥 셋트를 하나 사면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일부러 빅맥 셋트를 사서 먹고 가져온 것이다. 과거 이란의 석유장관은 석유 한 캔 값과 코카콜라 한 캔 값을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논 적이 있다. 그건 일종의 협박이었는데, 아마 많은 이들은 코카콜라가 그렇게 비쌌단 말이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쩄든 코카콜라는 하이네켄보다 맛있다.
문득 책장을 둘러보다가 시몬느 보봐르의 '자유로운 여자'를 꺼낸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다. 우연이 아닐 가능성도, 무의식의 알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책을 펼치면서 나는, 사 놓고 못 읽었으니 이제 찬찬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에는 몇 군데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집안에 나 외엔 줄을 그을 사람은 없고, 줄을 그었다는 건 내가 읽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나는 줄을 그었다는 건 둘째치고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 사고의 산물이라고 믿었던 몇 몇 명제가 이미 그 책에 줄과 함께 나타나 있었다. 과거의 책을 들춰볼때면 종종 겪는 일이지만 언제나 놀라곤 한다. 내가 지난 번 그 수많은 선택 요건 중 페미니즘을 골랐던 것도 사실은 운명처럼 예정되있었던 것이다. 다시금 라캉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사회화된다. 이 때 소외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타낼 수 없음을 뜻한다. 이는 전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외의 과정은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뤄진다.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로 부르는 순간, 코카콜라의 본질은 소외된다. 그 누구도 코카콜라의 본질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면 말이 개입되는 순간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가 아니므로.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禪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매우 친숙하게 들릴 것이다. 2년 정도 전에 나는 현각 스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의 제자인데, 숭산 스님은 2004년에 돌아가셨다. 나는 다비식에는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지 사흘 후에 화계사에 찾아가 영정 앞에 꽃을 놓고 그의 외국인 제자들과 맞절을 하고 왔다. 커피를 얻어 먹고 있는데 지위가 좀 있어보이는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 스님이 나와 동행자에게 조화를 옮겨줄 것을 부탁했다. 조화는 상당히 무거웠으며 매우 많았다. 그때 나는, 내가 만약 스님이라면 직접 옮겼을 것이고 그랬다면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은 안경을 쓰지 않았고, 숭산 스님 역시 마찬가지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숭산 스님도 안경을 쓰긴 썼다.) 이후로 나는 안경 쓴 애들은 스님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깨달음을 얻어야 좋은 시력과 싸가지를 얻는 것일까? 어쨌든 현각 스님은 안경을 썼고, 나도 안경을 썼지만. 내가 숭산 스님을 알게된 건, 순전히 도올 때문이었는데, 그의 불교 비판 서적을 읽고 난 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내가 불교 비판서를 읽고 불교에 매료됐으니, 그와 함께 도올은 소외됐다. 하나를 선택하면 무엇이든 하나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현각 스님은 코카콜라 캔을 가리키며 말했다. " 코카콜라가 여기 있습니다. " 그리고는 캔을 따서 마셨다. " 자, 이제 코카콜라는 어디 있습니까? "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로 따라오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 지금 그 코카콜라는 정화조를 지나 염소 소독 되어 어느 가정의 주전자에 들어있을지도 모를일이다. 그건 코카콜라인가?
동양적인 것은 신비롭지 않다. 그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서양에도 있다. 사실 동양이 신비롭다는 환상은 서양이 만들어낸 것이고, 동양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서양인처럼 생각하는 -- 매우 이상한 모습이다. 매우 당연하게도 지구 안에서 다르고 달라봐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신, 괴물, 외계인 등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니까. 신은 너무 신 같이 생겼고, 괴물은 너무 괴물 같다. 외계인은 또 왠지 어디서 너무나 많이 본 모습이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유태인의 위대함은 바로 추상적인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우상을 없앤 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 신을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상상력. 그들은 무엇이든 형상화하고 정의내리면 그 속에 인간적인 것이 녹아나 드러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무 것도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신. 그것 참, 위대하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 속엔 언젠가부터 신의 형상, 천사의 형상, 악마의 형상이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다.
타인의 말에, 어떤 글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역시 우리의 무의식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언어 속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은 우리 자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왜냐면 그것은 미약한 공기의 울림이거나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향을 받는다. 이때의 우리는 언어 속에 소외된 우리다. 생각해보라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카어로 욕을 하면 열 받을까.
고대로부터 문학이 위대한 무엇으로 추앙받았던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 자체가 문학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병신들, 저능아들은 딱 보면 병신이고 저능아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속이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환유하지도, 은유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는 보여주면, 우린 그들이 병신이고 저능아임을 알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츠하이머病에 걸려 벽에 똥칠을 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감추고 산다. 환유와 은유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치환하고 압축한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알 수 없고, 서로에게 다가설 수 없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라캉이 두 번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얘도 안경을 썼다.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1017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1017